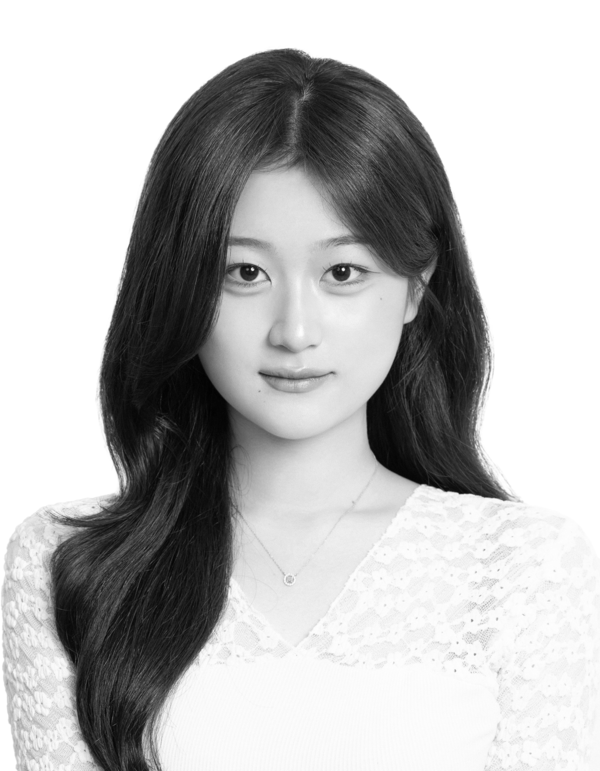
빨간 망토라는 동화가 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다가 할머니와 함께 늑대에게 잡아먹힌다. 이후 사냥꾼의 도움으로 구출되어 늑대의 배에 돌을 집어넣는 복수를 실행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일반 시민인 사냥꾼이 빨간 망토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기까지, 국가는 무엇을 했던가? 옆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음에도 늑대 출몰 지역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은 과연 크지 않은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에 불과하지만, 무겁고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피해자가 스스로 힘을 내어 일어서지 못하고 사적인 응징에만 그치는 상황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며, 우리가 소비하는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다.
여러 드라마와 영화는 해결되지 않은 억울함을 개인이 스스로 복수하는 구조를 그려내고 있다. 시청자들은 개인의 복수를 통해 억눌린 분노가 해소되는 듯한 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쾌감에는 불편한 진실이 따르게 된다. 우리는 왜 복수의 서사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대표적인 복수 서사의 예로 드라마 <더 글로리>를 들 수 있다. 주인공 문동은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가해자에게 복수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 시청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 복수가 마치 정의처럼 실현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형의 집행자가 되는 것은 법과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셈이다.
영화 <올드보이>도 유사한 시사점을 남긴다. 주인공 오대수와 이우진의 복수는 제도적 장치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개인적 원한으로 전개된다. 법의 개입이 차단된 세계에서는 인간이 끝없는 사적 복수의 고리에 갇히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 작품은 복수가 초래하는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동시에 관객은 그 과정에 매료된다. 그러나 개인의 정의로 여겨졌던 복수가 사실은 새로운 폭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조금 다른 결의 예로 공익을 위한 복수를 다룬 <데스노트>가 있다. 주인공 야가미 라이토는 법이 잡아내지 못하는 범죄자를 직접 심판한다. 이는 다크 히어로의 활약으로서 대중에게 큰 대리 만족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는 곧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독재적 권력을 휘두른다. 결국 이 작품은 복수를 위한 도구가 개인의 손에 쥐어졌을 때, 얼마나 쉽게 정의의 탈을 쓴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사적 복수’의 서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복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정의를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이다. 전자는 개인적 고통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새로운 상처를 초래하며, 후자는 권력적 폭력으로 변질되기 쉬운 특성을 지닌다. 두 경우 모두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복수 서사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 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제도의 미흡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사람들이 복수 서사에 몰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 구조를 즐기기 때문이 아니다. 제도 가 약자 를 지키지 못하고 피해자가 홀로 분노를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체감하게 되어 복수 서사에 열광하는 것이다.
빨간 망토가 사냥꾼의 도움으로 늑대의 배에 돌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 는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국가와 사회의 제도 미흡이 초래한 씁쓸한 결과 물이었을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 무기를 들 필요가 없는 사회, 다크 히어로의 존재에 열광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공정히 처벌받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