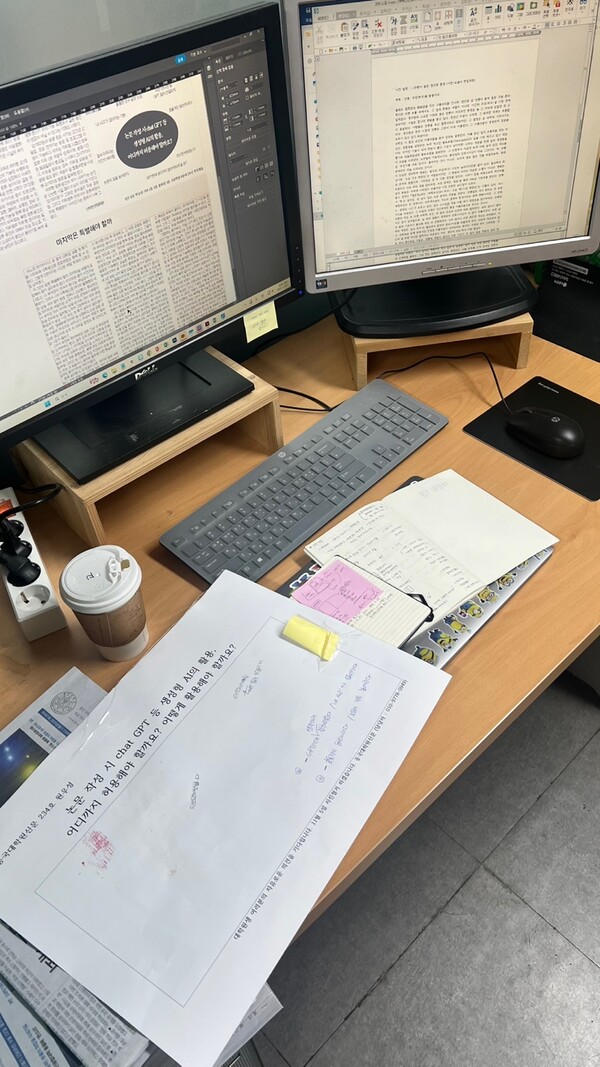
어느덧 마지막이다. 운 좋게 대학원 생활 첫 학기를 시작하며 대학원신문 편집위원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은 여덟 차례의 신문으로 남겨졌다.
이 2년의 끝은 특별해야 할까. 마지막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지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은 왠지 이전과는 다르고, 더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따라붙는다. 그래서 나의 대학원신문 마지막 발행호에 어떤 글을 써야 할지 한참 전부터 고민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에 어울리는 소재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리 마지막 글을 쓴다는 것이 마치 유언장을 준비하는 일처럼 느껴져 그만두었다. 게다가 대학원에서 보낸 시간 동안 매 학기 생각이 달라졌기에, 어떤 ‘정형화된 마지막’을 상정하고 쓰는 글은 결국 지금의 마음과도 어긋난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글은 평소라면 쉽게 써 내려갈 문장도 한 단어조차 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예전에 적어두었던 글은 그냥 내 메모장에만 남겨두려고 한다. 정작 진짜 마지막 신문을 만들 시간이 다가오니, 마지막을 근사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마음은 오히려 낭만적으로 느껴진다.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은 졸업논문, 병행 중인 아르바이트의 업무들 그리고 늘 그렇듯 마감 직전에서 글을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이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현실은 감상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문득 생각한다. 내 인생의 다른 ‘마지막’들은 어땠었나. 아직 끝보다는 시작을 보는 것이 더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졸업식은 지금 이 글을 쓰게 만든 감정의 단초를 제공해 준 순간이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던 졸업식은 언제나 특별하고 우수에 찬 장면으로 남아 있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생님과 학생도 학교를 떠나는 졸업식 때만큼은 서로를 다 용서한다는 듯 포옹하고, 그 어떤 균열도 봉합시켜 버리는 행사가 내 머리 속 졸업식이었다. 그렇게 무언가의 마지막엔 눈물 한두 방울 정도 떨어트려야 하는 것으로 나는 ‘마지막’이라는 환상을 학습 받은 것이다. 막상 내가 경험한 졸업식은 대부분 그보다 감정적으론 담담했고 환경적으론 어수선했다. 친구들로만 가득했던 교실은 부모님,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출동하여 사진찍기 바빴기에 1년 동안 내가 알던 교실과는 공기가 달랐다.
그렇게 졸업식이라는 소란스러운 행사가 끝나고서야 학교는 차분하게 마지막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나조차도 가족과 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얼른 교문 밖으로 나서야 했다. 그렇게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갔던 마지막 학교는 혼자 감상에 젖기엔 소란스러웠으며, 마치 분 단위로 이벤트가 짜여진 듯해서 행사 소화해내기에 불과한 느낌이었다.
비단 졸업식뿐만이 아니다. 장례식 역시 나에게 유사한 감정의 실타래를 이어주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오롯이 정리하는 것에 형식적인 면이 뭐가 이리도 많은지 나는 의문이었다. 겉으로는 정해진 장례의 절차를 군말 없이 따르면서도, 속으론 이 모든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인지, 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이런 부담을 나의 후손에게 안 남겨주고 싶다는 발칙한(?)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 깊은 의미는 모르지만, 관습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차들이 있어, 소중한 이의 죽음을 맞닥트렸을 때 당장 붕괴하는 것이 아닌 상실감을 잠시 미룬 채 내 몸으로 수행할 거리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하는 장례식의 필요성에 대해 내 나름의 의미를 찾아보기도 했다.
사실 어떤 마지막은 마지막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간다.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스쳐 간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마지막이었구나’ 하고 깨닫곤 하듯이 말이다. 마지막이란 그 시간을 점유한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서 그저 그 사람들을 위해 같은 시공간임에도 치장을 더하고, 뜻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문 글쓰기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나에게 자율성이 있는 마지막은 아닐까.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쓰기 위해 노력했고, 의미 있는 문장들만 남기려 했다. 대학원 신문에 처음 썼던 글을 다시 찾아보았다. 그 글에는 약간의 포부까지 담겨 있었다. 지금 보면 첫 학기였기에 가능했던 생각들이지 싶다. 2년이라는 과정 중엔 공개된 지면에 나를 드러내는 글을 쓰는 것에 약간의 두려움을 갖는 시기도 있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과거에 이미 누군가 남겨놓은 생각의 복제 같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이라 하며, 사람의 머릿수만큼 그 자리엔 의견의 개수가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학원에 와서 선배 선생님들의 폭넓은 학식을 보고 들으며,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가끔 날 압도하는 것은 내가 써 내려간 것들이 새로운 무언가가 아닌, 과거에 존재했던 것의 복제일 뿐 아닐까 싶은 무력한 의구심이다. 어쩌면 그래서 나는 이 형식적으로나마 주어지는 마지막이라도 잘 끝맺으려는 것은 아닐까.
다만, 달라진 점은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위에 억지로 특별함을 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저 지금의 나를 담담히 남겨두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지나온 시간은 이미 기록으로 존재하고, 마지막은 그 기록의 끝을 조용히 닫는 일일 뿐이다. 꼭 장식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지막은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