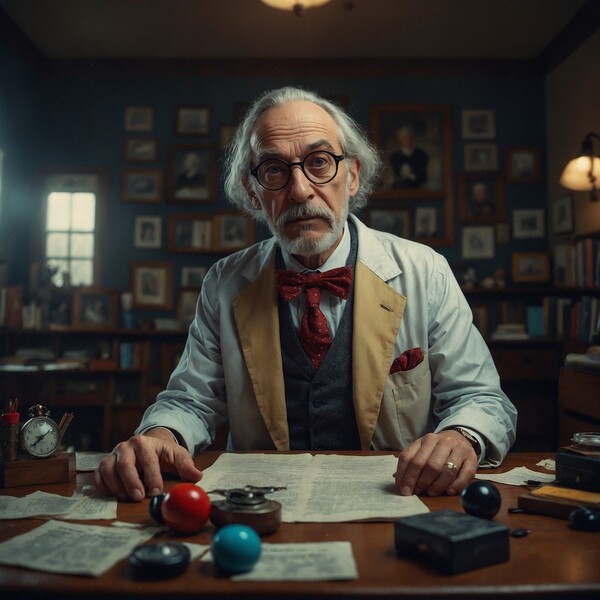
최근 한국에서 교수들의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대학가에도 고령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국공립대 교수 노조는 교육부와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것을 협의 중이며 한국폴리텍대는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키로 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정년 후 교수’를 선별하는 방식도 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교수들의 정년 연장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시선과 연구 성과가 부족한 60대 교수의 정년 연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공존하며 보이지 않는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전자의 경우 축적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수들에게 65세 정년은 너무 짧으며 교수 임용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에 따라 이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후학을 양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령 교수들은 그들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구 환경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연구비 수주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대학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60대 교수가 가진 학문적 깊이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교수들의 성과와 업적은 나이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이상 이공계 전임 교수들의 1인당 과제 수는 1.34건으로 30대 이하 1.87건, 40대 2.26건, 50대 2.05건에 못 미친다. 인문 사회 분야 역시 60대 이상의 1인당 과제 수는 0.65건으로 30대 이하 0 .7 1건, 4 0 대 0.95 건, 5 0대 0.91건보다 낮은 수치이다. 나이가 많은 교수들의 경우 새로운 학문 트렌드를 파악하는 감각이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것이 편견일지라도 그들이 쥐고 있는 학교 내에서의 위치, 연구 환경 등을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60대 이상의 교수들이 가진 학문적 연륜은 정년 연장이 아니라 정년 후 석좌교수나 명예교수의 형태로도 충분히 발휘 가능하다고 보는 시선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4년제 대학교 소속 전임 교수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교수 중 60대 이상 전임 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1%로 2018년 20.7%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화 열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교수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으로 불붙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